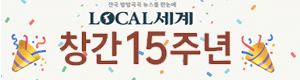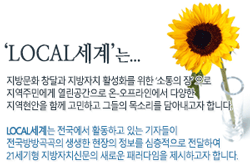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로컬세계 이태술 기자] 당나라 시인 이백(701~762)의 詩 자견(自遣)을 소개 통해 깊어가는 가을 시를 통해 일상에 지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자.
자견(自遣)
 |
| ▲ 이태술 기자 의 문학기행 © 로컬세계 |
잔을 기우리다 해 저문 줄도 모르고
落花盈我衣 (낙화영아의)
떨어진 꽃잎이 내 옷을 가득 덮었네
醉起步溪月 (취기보계월)
취해 일어나 달빛 밟고 걷노라니
鳥還人亦稀 (조환인역희)
새들은 이미 돌아가고 인적 역시 끊기었네
唐詩(당시)에 자견 이라는 제목의 시(詩)가 몇 수 있다.
자견이란‘ 스스로의 마음을 달랜다’ 또는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풀이 된다.
唐詩(당시)중에 이백의 자견(自遣)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詩 한편을 소개한다.
적막한 가운데 주산(酒仙)이라고 칭함을 받던 이백이 깊은 골자기 개울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신다.
그는 시성(詩聖)이라 칭(稱)할만큼 문학적인 업적은 중국 역사 이래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고 평생 현종 때의 미관말직이 그가 한 벼슬 이었을 뿐 주유(周遊)하고 은거(隱居)했지만 벼슬길을 잡지 못했다.
이 시는 은일자(隱逸者)의 고요하고 깊은 삶을 노래했다.
‘낙화에 묻힐 정도로 흐트러짐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가? 그것도 진종일을... 그리고 취해 달빛 젖은 개울가를 도포자락 흔들며 돌아간다...’
마치 수행자의 모습처럼 단정하기도 하다.
그의 절창 장진주(將進酒)를 보면 그의 호탕한 음주벽이 잘 나타난다.
莫使金樽空對月 (막사금준공대월)
금 술잔을 어찌 달빛아래 그냥 둘 수 있느냐며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노래하며 한 번에 삼백 잔은 마셔야 한다는 이백의 호탕한 기개는 다 어디가고 쓸쓸한 산골짜기 개울가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가?
李白騎鯨飛上天(이백기경비상천) 이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가니
江南風月閑多年(강남풍월한다년) 강남의 풍월 몇 년이나 한산하다
縱有高亭與美酒(종유고정여미주) 높은 정자와 좋은 술이 있다하여도
何人一斗詩百篇(하인일두시백편) 누가 술 한 말에 시 백편을 지을까
달을 따러 강에 들어 하늘나라로 가신 적선이여 그대는 지금 어드메 계시느뇨?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