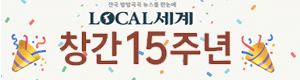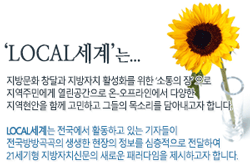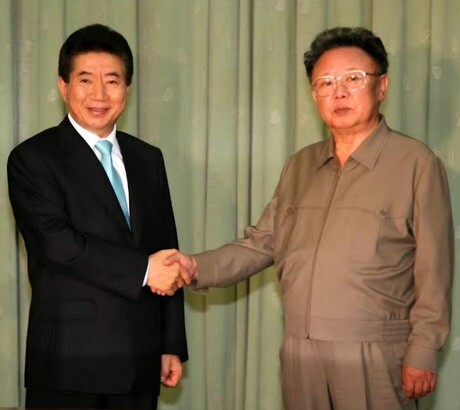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그런데 산업사회의 국제적 진출을 목표로 세계시장에 우리나라의 상표가 알려지면서 한국은 세계인들의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화사상의 물줄기가 서서히 문화 속에 침투되어 가면서 변화하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산품의 질과 더 놀라운 한국 스포츠의 발달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므로서 변화는 관심 속에서 이뤄진다.
서구 자본주의의 물결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해외여행 문화가 커지면서 서서히 국제화 시대로 변하여 간다. 그러다 보니 소위 국제결혼도 많이 성사되므로서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도 많은 변화를 이끄는데 한몫을 한다.
나라가 부강해지니 해외 유학도 많은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 국제적인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한국인의 위상을 알렸다. 이 모든 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너무 빠른 선진 변화다.
변화는 우리를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원리가 가진자들의 행패처럼 사회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처럼 때와 장소가 바뀌어 가듯 시장의 변화가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왔는데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이라는 서열 계층이 형성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살기가 힘들다고 불만의 소리가 사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만들이 사회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불만의 사회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어설픈 정치판의 하수인들처럼 지지하고 돌아서면 허탈한 국민이 되어 버리니 다시 사회 불만으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다. 왜 그런가?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힘 때문에 서민들의 불만처럼 이어진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군사정부 부터서 국민들을 짖밟은 정치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권략과 정치는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형식적 달래기 차원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처럼 신분 계층을 형성하듯 사회가 자연스럽게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자 아니면 서민들로 전략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할 수가 있는가? 묻고 싶다.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중산층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 초라하다.
일부 국민들이 불평등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불평등을 여기저기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서로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주택문제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갈수록 주택문제는 우리의 숙제이다. 직장 생활에서 보람된 것은 주택을 구입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사는 것인데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모든 사회 불평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부의 건전한 부동산 정책으로 하루빨리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희망이다. 지역마다 재래시장의 넓은 땅들이 기능에 비해서 비생산적이다. 그 곳에다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1층~3층까지는 재래시장 기능도 살리고 고층으로 싸게 주택도 보급하는 방법도 있다. 그 희망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