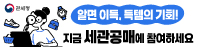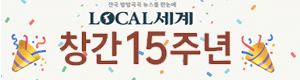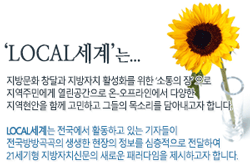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
|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우리의 문학이 그토록 제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미진한 지원이 문학의 뒤떨어진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정치적으로 그냥 통틀어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수들의 노래나 영화에 비유해서 마냥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 전통과 우리의 순수 문학이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문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문학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는 영역이 된다. 작가들이 해외를 유람하면서 보고 듣고 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글로서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은 산교육이나 마찬가지로 작품의 완성도가 현장감 있게 전개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핸드폰이 주가 되어서 글도 인터넷에서 보고 읽는다. 이것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책방 문화가 우리의 정서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주가 되어 버린 독서의 세상을 쉽게 밝힌다.
과거처럼 책으로만 발표되던 출판도 이제는 서서히 전자출판도 주류를 이루는 현실이다. 그렇다. 우리 문화가 거기에 맞춰서 진화되어야 하는데 작가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책을 읽는 문화가 정서적으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예술 분야는 활발하게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며 어필되어 간다. 왜 그러면 문학은 독자와의 거리가 있는가? 우리의 공교육 부터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생활 습관으로 길들어져 가고 있다.
지나치게 공교육은 시험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지 생각과 자신의 취미에서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제도가 막혀 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시험 위주의 강박 관념 속에서 청소년들이 지친다. 청소년들에게는 운동과 독서는 이 나라의 미래 자산인데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오로지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고집하는 사회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주는가? 입시 위주만 하여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독서보다는 이제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강박 관념만 지고 산다. 그렇다면 언제 자신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 졸업장 하나만 들고 나왔지 사회생활에서 인간사의 풍부한 지식은 하나도 없는 빈 깡통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문제에 부딪히면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생활로서 자신의 아집만 늘어가는 생활 문화가 우리 사회를 폭력과 무질서로 이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되려면 너도나도 우리 모두가 책을 많이 읽는 사회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독서 운동도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이다. 그러려면 정부의 독서운동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