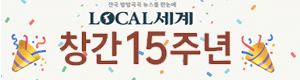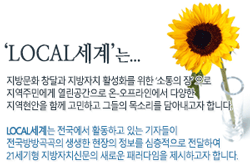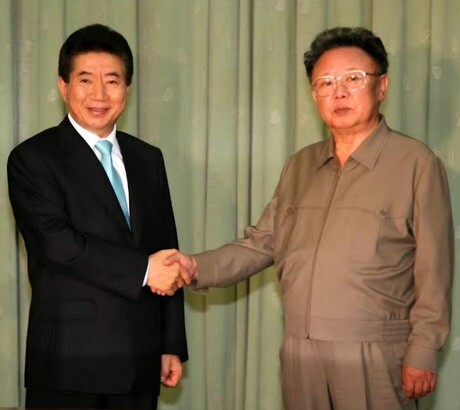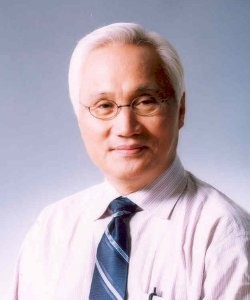 |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이과대학 명예교수 |
불만족한 사회(Discontent Society) 인간이 정주하면서 불편한 것이 많았다. 그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이었다, 그 외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상 기후적 조건이 농민으로의 불편이었다.
그러므로 불편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은 비교가 무엇보다 불편이 발생한다. 그래서 풍수이론으로 [배산임수]는 자연적인 것이며 그것 외 인공적은 것은 타인과 비교로 발생하는 불만 역시 비교에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수확량에 관한 것으로 [옛말에 99섬한 사람이 1섬한 사람보고 1섬을 100섬을 채우게 달라는 것 즉 만족 불만이 소유욕과 생산욕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삶의 시대는 변화는 것 즉 문명이 진보하면서 비교하므로 불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고르게 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발전을 저하하므로 누구든 노력 부지런히 일하여 농사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하거나 또 퇴비를 잘 만들어주어 더 많은 수확을 올리는 것 등 양의 차이가 결국 불만이 난다. 자식이 10명 중 부모의 사랑을 나는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만이 때로는 발전을 때로는 퇴보 전환하기도 하는 단어가 불만 이다.
삶에 있어서 불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만족이 불만이다. 그로므로 그것은 비교 즉 비교 우위인 것이다. 그것은 생각하는 인간이므로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 성장 발전 등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현재 디지털문화가 불편을 해소 즉 불만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의 시대이다. 그래서 누구나 냉장고 전기세탁기 등이 있어 불만이 그리 없는 것 같으나 인간이라서 욕심이 강하게 작용하여 더 편리하고 더 풍부한 힘 안드는 것이겠지만 그 외 가장 큰 것은 이웃집 또는 친구와 비교해서 나는 월급이 적은 것 그것이 불만인 것이다.
그 틈을 타고 관리자들은 자신의 편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찬스를 얻어 리더가 되면 불만을 만족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쓰면 발전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는 아니 국가는 소멸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만을 없애기 위해 능력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하는 것도 결국 불만이 발생해 자유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모자라라는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불만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불만해소의 삶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개개인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통털어서 관리하는 사회 또는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만의 경계와 출발과 끝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은 잘 되었다 해도 그 사회가 그런 것을 인증하지 않고 있다면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그다음은 불만이라는 생각이 안들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적 성장에서 다양한 통제를 받아 왔으며 개인의 불만을 넘어 가족 전체의 불만이 강화되었던 적도 있어 불만을 개선치 못하였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도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불만은 사회적 특성 때문이며 그것은 관리적 특성에 따라 더 강약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이과대학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한국갈등조정학회장. (사)해양문화치유관광발전회고문. (주)이앤코리아고문. New Normal Institute연구소장.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mwchoi@konkuk.ac.kr]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