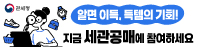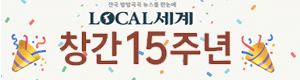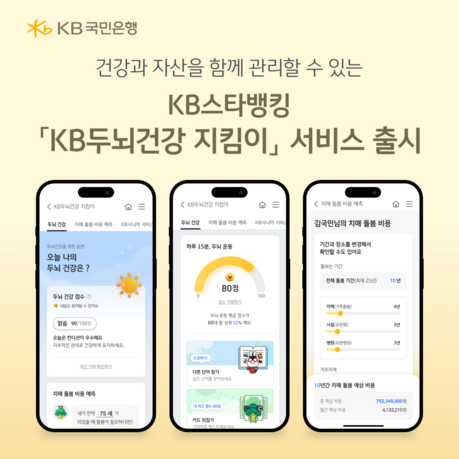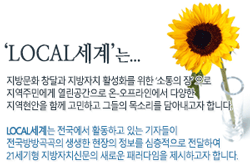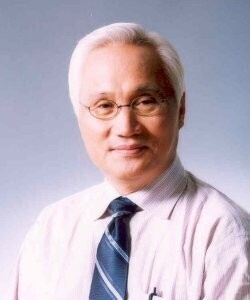 |
|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
최근 세계 각국에서 철포의 강우와 계절에 관계없이 기상과 기후변화로 농사에 충격을 주어 생산량이 급감하여 개발도상 국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부자나라는 1인당 GDP의 평균1.5%가 더위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의 인간은 잘 모르는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의 충격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싶다.
지구상에서 무더위로 혜택을 받는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더위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므로 지구의 순환적 변동처럼 느껴져 별 생각이 없었지만 예상치 않았던 장시간의 폭우와 강한 빛 즉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영향은 지역주민에 생사를 걱정하게 되어 진 것이 경제적 충격이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별생각을 하지 않은 후 엄청남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뒤늦게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위적 기상 기후변화는 원하지 않은 곳에 강우나 눈 등이 오는 것과 필요한 장소에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기상현상 이다. 우리는 강우의 집중 호우로 산사태 농경지 매몰 또는 없어지고 있거나 주거지와 함게 주거인들이 급류에 휩싸여 생명을 잃는 현상이 지구 여기저기에서 데이터가 나왔다. 이는 에상치 못한 현상이지만 이것은 CO2발생이 균형을 파괴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CO2를 줄여야 하는 것은 UN이 지구의 나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구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혼합되므로 지구의 기후는 기하급수적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16조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인공적 손실이 식량 불균형적이 되어 나라간 분쟁으로 더더욱 먹거리 문제가 커졌다. 그러므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경제적한 손실이 시간과 더불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역에서는 식량에 큰 문제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자연은 예상치 못한 기상 기후 변동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경제적 손실 이다. 그러므로 기후에 따른 열파로 1980년대 이후 약 16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가 온난화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을 낼 것인지 분쟁이 있었으나 세계부유국은 GDP의 평균1.5%가 무더위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세계 최빈국은 1인당 GDP의 6.7% 훨씬 큰 손실을 입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관여와 영향력도 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CO2에 배출량에 따라 온난화 즉 열에 의한 충격을 반기는 나라도 있는 것에 없다고하지만 실제는 인간이 생산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비구에서 비교적 저온 지역은 대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위38도 이상에서는 사과와 배가 생산 안되었으나 지구온난화로 사과와 배가 재배되어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있는 것이 즉 온난화로의 이익인 것이다.
이것 뿐 아니라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과일이 오랜만에 자유롭게 생산되어 농민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온난화의 혜택 이다. 그러하지만 지구전체적으로 보면 16조 달러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장은 인간이 생성하는 CO2보다 지구의 순환으로 발생하는 것이 더 큰영행이라는 사람들은 지구가 46억년동안 대기 중의 성분이 즉 산소가 크게 변동 순환한 것이 지구의 기후라는 것이므로 인간이 발생하는 이산화가스는 조적지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확실한 증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인간이 관리한다는 것에 중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아니 80억 인구가 생산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생태적 순환인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그 발란스가 맞고 있으며 그것은 지구의 식물들의 탄소동화작용으로 그리고 지구의 위도와 경도의 차이는 양과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이동이며 그것은 인간세가 현재이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간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은 지구사람들이 단결하기 위한 하나의 한 방법이며 그것은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런 것은 현재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것이다.
지구역샤 45억년동인 인간이 지구의 기후육성 성분에 대하여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은 모두가 잘 하는 것인데 졸지에 그런 이야기로 이어가고 협력하고 만나서 즐겁게 그리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결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지구의대기원에 인간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순간일 것이며 그것이 장기적인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자기장 그리고 2억년 간 산소가 없었던 시기 등이 인간이 대기 중의 성분 농도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현재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의 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지구는 지구를 둘러 쌓고 있는 대기층이 후랙시불하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의 삶의 방법이며 이웃 간의 친목 도모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들이다,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이 지구가 순환하는 것을 변동시키는 능력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Moowoong Choi, Ph.D, Konkuk University).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땅물빛바람연구소장.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