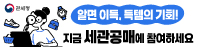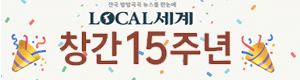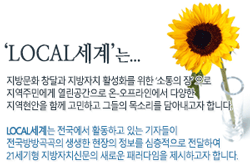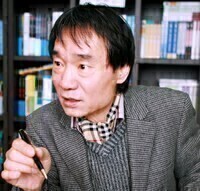
본 칼럼 제7회에서 '삼국지'「위서」에 ‘한 무제 2년에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여 한나라가 고조선 전체를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구성하고 있는 3조선 중 하나인 위만조선, 즉 번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영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것을 실증했다.
그런데 '사기'「조선열전」「고조선」에,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한(漢)을 배반하고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위만(衛滿)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명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동의 요새를 나와 패수(浿水)를 건너서 진(秦)의 옛 공지(空地)인 하상장(上下鄣)에 살았다. 점차 진반과 조선의 만이(蠻夷) 및 옛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험(王險)에 도읍을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진의 옛 공지라는 것은 고진공지(故秦空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고진공지(故秦空地)는 번조선과 진(秦)나라가 국경을 정하면서 양국의 중립 공지로 정한 땅이었으나, 기원전 200여년 경에 기준이 번조선 왕으로 즉위한 후 중국의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난리를 피하여 귀화하는 중국인들과 상곡・어양 등지에 살던 조선 유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곳이라고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위만이 패수를 건너 번조선에 망명한 후 고진공지에서 세력을 키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위만조선 영역이 고진공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서'「지리지」에 ‘현토군의 고구려현 요산(遼山)에서 요수(遼水)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 요수(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산해경'에 ‘요수(遼水)는 위고산(衛皐山)의 동쪽에서 나온다. 경계 바깥의 위고산이다. 현토군 고구려현에 요산(潦山)이 있는데 소요수(小潦水)가 여기에서 나온다. 서하의 남쪽으로 대요(大潦)가 흘러들어가는데, 그 독음은 ‘요(遼)’이다. 동남쪽으로 발해(渤海)로 흘러가 요양(潦陽)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인용한 한사군의 위치에 관한 중국 사서의 기록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면, 패수를 건너와 번조선에 망명하여 고진공지에서 살며 세력을 키운 위만이, 번조선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여 다스리던 위만조선의 영역에 설치된 한사군 중에, 현토군에 소속된 고구려현에서 발해와 요양으로 흐르는 요수 즉, 요하가 발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토군 고구려현에서 요하가 발원하고,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곳은 위만조선이니, 위만조선에 요하나 혹은 그 지류로 소요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강이 있어야 한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만조선과 요하는 물론 고진공지와 요양도 한반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으로, 한사군의 위치가 북한의 평양 운운했던 기존 통설은 그 가치를 잃는 것이다.
더더욱 고구려 건국 연도가 기원전 217년으로 재정립되면, 고구려의 첫 수도는 북진 의무려산이고 위만은 고구려 건국 22년 후인 기원전 195년에 번조선으로 망명했으니, 고진공지와 패수는 물론 위만조선 영역에 설치된 한사군의 위치 역시 북진의 서쪽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패수를 난하로 비정(比定)할 수 있고, 한사군이 설치된 위만조선의 영역을 표기한 [그림 1]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한사군은 번조선 영역인 위만조선 영역에 존재했으므로 현토군의 고구려현 역시 위만조선에 존재해야 하므로, 만주 대부분을 차지했던 진조선 영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고구려와는 상관없었다는 것이 규명된다.
현토군의 고구려현과 연관된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날조된 허상으로, 고구려와 고구려현은 별개이며, 고구려현이 행정구역으로 속해있던 현토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의무려산 서쪽에서 난하 유역에 걸쳐 설치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