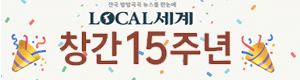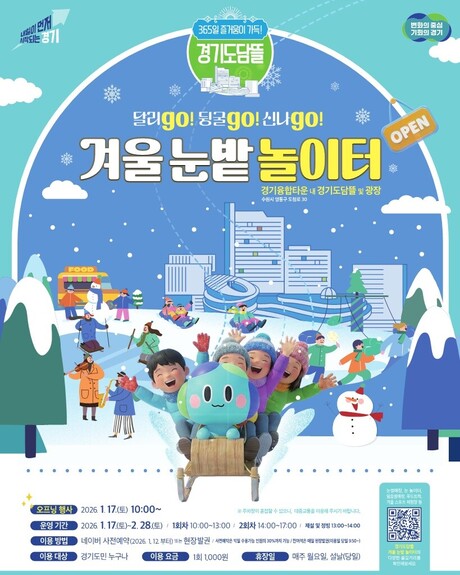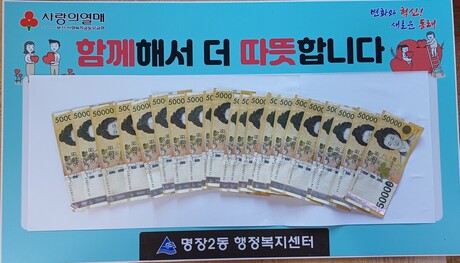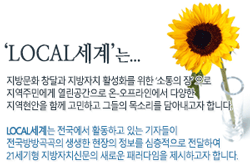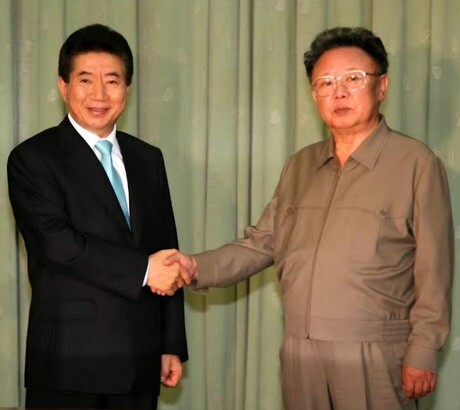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정영덕 부산 기장소방서장. |
올해 9월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 화재 시 집안(44층)에 있던 6개월 아기와 어머니가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평상시 어디로 대피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어머니 본인 뿐 아니라 아기의 목숨까지 위험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2019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40,103건)의 27.6%(11,058건)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 중 12.1%
(4,837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화마가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다. 안타깝게도 전체 가구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양방향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동주택 화재 시 우선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 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에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으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에 위치하여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시 피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본래의 용도로 잘 관리한다하더라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피난이 쉽지 않다.
소방관서에서도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먼저 내 가정의 피난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언제든 사용가능하게 관리한 후 이웃에게 위치와 사용법을 알려준다면 이웃 간의 신뢰와 가족을 비롯한 입주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통로이며 내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