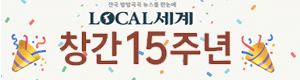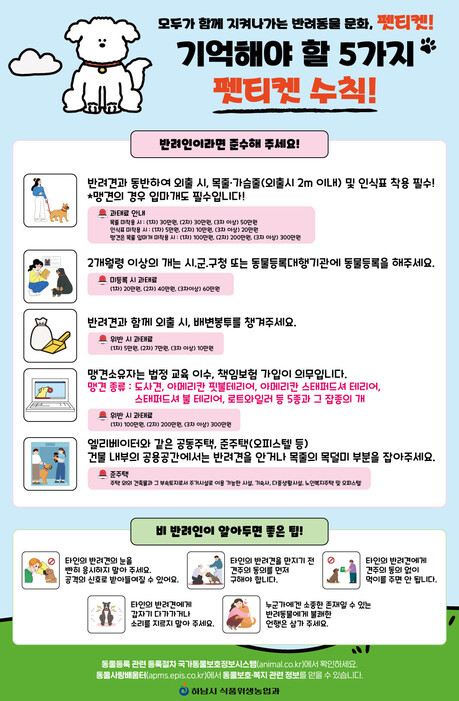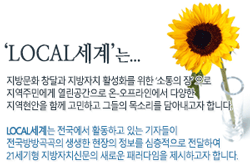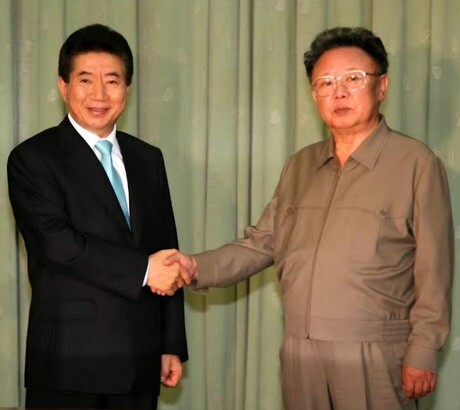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다만 여기에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이 번역 과정에서 등가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의 인식론적 언어에서 다른 인식론적인 공간으로 옮겨 가는 것이 번역이다.
그런데 만약 그 번역이 잘못되어 버리면 문학 작품에 담겨진 개인과 집단의 사회, 역사, 문화적인 의식과 전통이 그대로 옮겨 가는 것은 주요 언어와의 언어적 문화적 근친성과 공유점이 멀수록 많은 난제와 부딪치게 된다.
근대화를 향한 출발이 늦어 문화적 주변에 머물렀던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역시 번역이 가장 큰 난제였음은 당연하다. 한국 문학의 번역과 출판 지원 사업이 시행된 1980년 이후 40여 년 동안 한국문학의 번역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러면서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번역자 중심의 번역 (~1990년대 초)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번역자와 한국문화에 밝은 외국인 번역자 공동 번역(~2010년대) 한국어에 능통한 원어민 번역자 중심의 번역 92010~현재) 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한국문학이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주목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악트쉬드(Actes Sud) 와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 두 출판사가 한국문학을 본격적으로 펴낸 데서 찾을 수 있다. 당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이문열과 이청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는데 프랑스 문학계와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한국문학의 존재감이 생기면서 2002년 노벨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외신들이 고은을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한 것도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한국문학이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작가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지만 정부의 뒷받침은 필수인데 우리 정부는 과연 문학 작가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와 권력의 휘두르는 영달 앞에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지 먼 미래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어 교육도 다변화 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도 사실상 국가의 무관심이다. 이제 한국문학은 세계문학 속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가수들의 노래도 영화도 이제 세계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호한다. 그런데 한국문학의 우수성은 있으나 세계 속에 자리 매김 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너무 부실하다.
이제 문학인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문학 작품의 세계화로 우수 번역자들을 정부에서 추천하여 앞장서서 한국문학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한국 작가들의 문학성은 우수하다. 그런데 번역의 장벽이 있기에 원어민 번역자는 정부가 양성시켜 추천되어야 한국문학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진국에 걸맞게 문학인들의 처우 개선과 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에 한 번도 받지 못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빨리 전해올 것이라 생각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