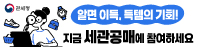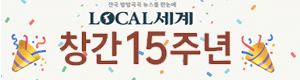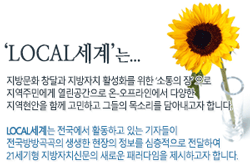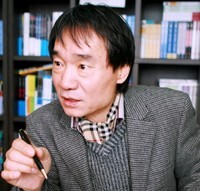 |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개인 간에 매매나 교환 등의 합법적 조치 없이 남의 땅을 내 것이라고 우긴다고 내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토권 역시 합법적 근거 없이는 국적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대마도의 지적문화는 대마도의 영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마도가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조정에 판적봉환 봉답서를 제출한 것은 1869년 6월 19일이지만, 그 봉답서를 작성한 것은 1868년 10월 8이다. 일본에서 최초로 판적봉환을 시행한 4개의 번들이 1869년 1월 20일 봉답서를 제출한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서서 봉답서를 작성한 것이다. 도대체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마도가 어떻게 판적봉환을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으며, 판적봉환 할 생각을 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대마도가 판적봉환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정한론(征韓論)이다. 정한론은 한반도를 정복한다는 것으로, 일본 열도에서 정한론을 들먹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들의 내부 결속이 필요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구실로 무언가 일을 꾸밀 때 으레 들고나온다.
에도 막부시대 사무라이들은 1603년 막부 수립 이후 1867년 대정봉환까지 평화 시대를 보내면서, 말 그대로 놀면서 녹봉만 받아먹는 무사들이었다. 그런 그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착안한 것은 기도 다카요시 측근인 이토 히로부미다. 혁명을 위해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 주도 세력인 조슈번의 실세 기도 다카요시에게 사무라이들을 혁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무라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최고의 사무라이로 일컬어지던 사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동맹을 맺을 것을 권한다. 그가 동참한다는 것은 일본 군사력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메이지 유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에서였다. 그런데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했다. 그 미끼가 바로 정한론이다.
에도막부 수립부터 대정봉환까지 2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평화 덕분에 무위도식하며 녹봉만 축내던 사무라이들에게 정한론은 아주 반가운 미끼였다. 사이고 다카모리 자신은 물론 그가 사무라이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가장 좋은 제안이었다.
그 제안에 사무라이들을 대표한 사이고 다카모리는 기도 다카요시와 삿초 동맹을 맺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다. 물론 정한론은 메이지유신 성공 후인 1871년 기도 다카요시가 일본 내 부강이 더 중요하니 먼저 일본의 실질적인 부를 통해서 강한 힘을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배신하여 무위로 끝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 바로 대마도다.
기도 다카요시와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맹에 힘입어 메이지유신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하여 1868년 메이지(明治)를 연호로 무쓰히또(睦仁) 일왕이 친정을 시작했으나, 권력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거둬야 했다.
따라서 재원이 되는 땅과 백성을 임금에게 바치는 판적봉환을 실시해야 메이지유신이 완전히 성공하는데 각 번 다이묘(大名; 에도막부 시대 각 번의 지배자인 영주)들이 선뜻 나설 것 같지를 않았다. 그래서 착안 한 것이 바로 대마도의 판적봉환이다.
사무라이들을 동원해서 대마도주를 처참하게 굴복시키고 봉답서를 받아 내는 것을 다이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판적봉환에 참여하지 않을 때 처할 상황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사무라이들에게는 대마도를 시작으로 정한론에 돌입한다는 기대감을 불어 넣어 판적봉환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게 만든다는 속셈이었으니, 그 과정은 말할 나위 없이 참혹했다.
물론 그 당시 조선의 쇄국 정치로 인해서 조선과 일본의 교역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니 대마도가 중간무역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힘든 까닭에 대마도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는데 조선 조정은 이렇다 할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쌀도 지원해 주고 농사지을 땅도 내준다는 등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적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당장 대마도주인 종의달 자신은 물론 대마도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봉답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