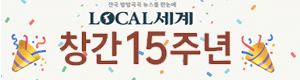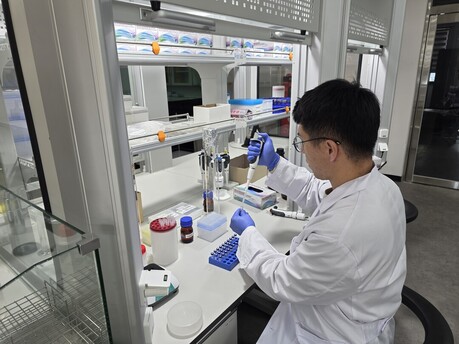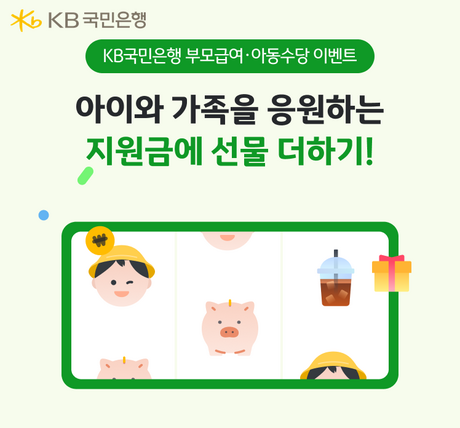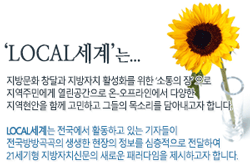소비자들만 피해 악순환
 |
| ▲고인의 시신과 영정을 실은 운구차가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기관에 대해 공정위가 설립 인가했고 상조회사는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258개 상조회사 중 83개사로 삼분의 일만이 가입돼 있다.
공제조합 가입조건을 못 맞춰 상조공제에 미가입한 175개의 상조회사 회원들은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 등을 하면 회원들의 납입금은 한 푼도 받을 수없는 상황으로 상조공제가 반쪽짜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상조무용론의 확산으로 신규 회원 가입이 늘지 않고 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다수의 상조회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상조공제 미가입한 회사의 상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조공제에 가입된 회사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에 대비한 담보금인 선수금이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공제가입 회사들의 총 선수금은 2조6421억 원으로 이 중 선수금의 50%인 1조3210억 원을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의 담보금은 2947억원으로 무려 1조263억원이 부족해 자칫 소비자피해 대란이 예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국내 대형 상조회사의 A사 한 곳 만 선수금이 4428억원으로 만일 이 회사가 잘못될 경우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에게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으로 조합자체가 무너지면 상조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계하며 “이는 처음부터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피해를 우려했다.
상조공제조합이 부실로 치닫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공정위가 ‘낙하산 인사’로 조합이사장에 공정위 출신들을 포진시킨 것이 부실운영에 한몫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출범 다음해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도 2013년에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돼 지난해 6월 사퇴한바 있다.
상조공제 출범 이후 낙하산으로 간 공정위출신 이사장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상조협회(회장 송기호)도 지난해 8월 공정위 책임자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상조회사들 사이에서도 공정위 출신 이사장과 공제조합 부실운영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는 비단 상조공제조합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정위가 인가권을 갖고 있는 4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상조보증공제·특수판매공제·직접판매공제) 전반에 걸쳐 있었던 문제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로 불거진 관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공정위의 낙하산은 잘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상조회사가 결혼과 장례 서비스업을 시작한지 30여년이 됐다.
30년 성인된 상조시장은 지금 상조 본연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들의 납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마치 눈먼 돈 인양 제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상조회사가 수의용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등 상조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불신은 팽배해 있다.
상조회사의 과다한 영업비 지출과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속에 폐업이나 등록 취소된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수의 상조회사가 사라질 전망이며 따라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상조문제가 우리사회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언제 터지질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상조대란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