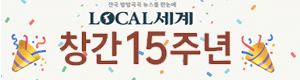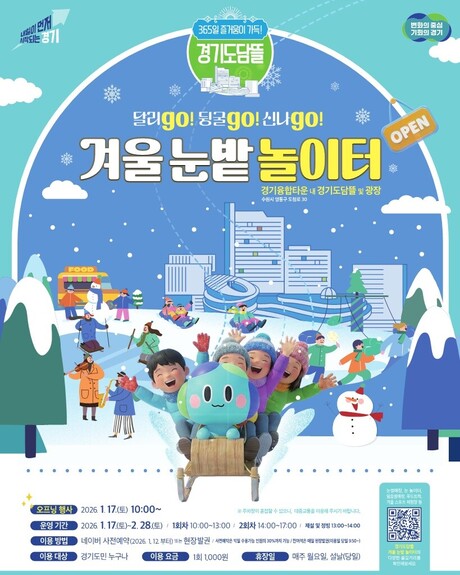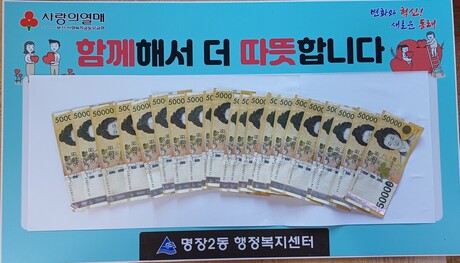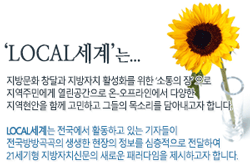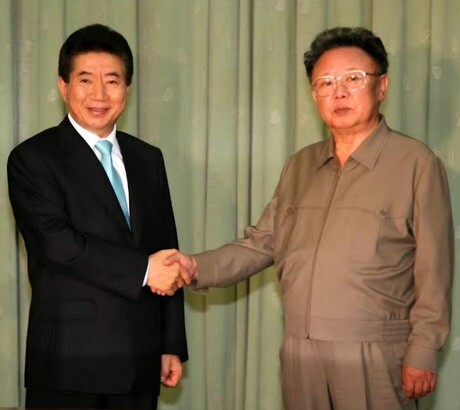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 |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기술한 것처럼, 겉으로는 인류의 평화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다. 세계적인 여론의 압박에 휩싸여 일시적인 화해라면 모를까, 갑자기 두 나라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대적 약소국 중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럴 때면 광해 임금이 그리워진다. 광해 임금이야 말로 내 백성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용상까지 아낌없이 내주고자 했던 분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백성들의 행복을 고민하다가 터득한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돈 없고 신분이 낮은 백성들에게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그릇된 세법을 바꾸기 위해서 각자 소유한 논을 기준으로 그 소유의 비례로 쌀을 세금으로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다. 당연히 논을 많이 소유한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사대부들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보여준 그분의 백성 사랑은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아울러 홍길동전을 저술한 허균과 모종의 일을 꾸몄다.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부르짖던 사상을 현실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사람이 태어난 신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양반과 상민이라는 반상을 타파하여 그 능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허균과 함께 노력했던 분이지만, 결국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주려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하고, 광해 임금은 서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인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음에 이른 비운의 왕이다.
하지만 광해 임금이 청나라와 명나라가 전쟁할 때 명나라가 파병을 요청하며, 조선이 청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보여준 기지야말로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었기에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다.
'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6월 14일 정해 2번째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67년 청 강희 6년 제갈 무후·김응하·정문부의 묘호와 문원공 이언적의 원호를 내리다. 김응하(金應河)의 묘호를 포충(褒忠)으로 내렸다. 김응하는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무오년에 심하(深河)의 전쟁에서 절사(節死) 했는데014) 집이 철원에 있었다.
[註 014]김응하는 선천 부사로 무오년에 심하의 전쟁에서 절사 했는데 : 심하는 요동(遼東)에 있는 지명. 명나라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조선에 파병을 요구해오자, 광해군이 무오년(1618)에 강홍립 등을 요동에 파견하였다. 강홍립 등이 심하에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광해군의 밀지가 있다고 하고 청나라에 항복하자, 선천 부사 김응하는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21 심하지역(深河之役).”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의 손자 현종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한 김응하에게 묘호를 내렸다는 기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각주 014에 적힌 광해군의 밀지다.
광해군은 이미 기울어 가는 명나라의 파병요청에 응해서 공연히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적당한 시기에 항복해서 목숨을 보존하여 귀국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아울러 청나라에게도 조선은 청나라와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했던 왕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지로 발휘한 외교술이다. 그러나 그 기지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지였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명나라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우기던 사대부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조정을 지배하고 있던 사대부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광해 임금 시절과 지금 우리 현실은 무엇이 다른지 깊이 반성해 보면, 광해 임금의 지혜를 그리워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워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허균 같은 신하를 중용하여 기지를 발휘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다. (끝)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