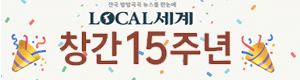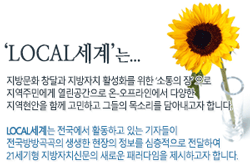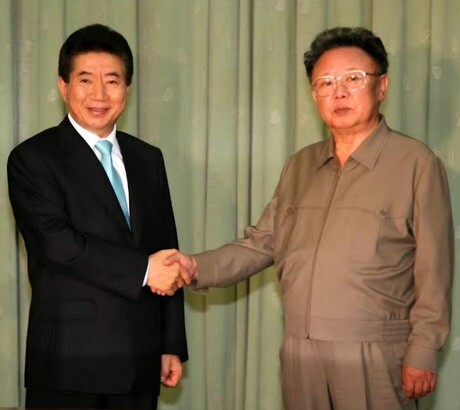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소금동불 관음보살 입상 앞면. 소장자 이무용. |
[로컬세계 = 글·사진 이승민 기자] (주) 이안 R&D를 이끌고 있는 이무용 회장은 고미술품 수집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가 돌연 국보급 소장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해 고미술품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회장은 7세기 중반에 제작된 국보급 금동불상과 청자새모양주자 등 다수를 소장하고 있다. 관음보살 입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상 연구에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고, 청자새모양주자는 고려시대 12세기의 걸작으로 당시의 모형 그대로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관음보살 입상은 전체 높이 54cm, 입상 높이 46cm의 대형 소금동불이다. 머리 정면 연화 위에서 화생(化生)하는 선정인(禪定印)의 아미타여래에는 두광과 신광이 따로따로 표현되어 관음보살(觀音菩薩) 임을 알려준다.
삼국시대 금동불은 통불이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배면의 투공이 커져서 내형사(內型士)를 제거하게끔 했다. 반개(半開)한 눈에 깊은 명상에 잠긴 얼굴로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양옆에 매우 작은 금속제 무량보주(無量寶珠)가 부착된 것도 이 불상의 절제성을 보여준다. 머리 위의 머리칼이 제1 영기싹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아 여래의 얼굴이 보주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조선시대 목불에서 발견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렇듯 간단명료하게 제1 영기싹을 표현한 것을 보기는 처음이다.
 |
| ▲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대형 소금동불 관음보살 입상 뒷면. 소장자 이무용. |
제1 영기싹도 조형언어의 4가지 형태소(形態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주에서 생긴다. 두 손은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맺고 있는데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여 수인(手印)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천의는 뒤 등을 돌아 앞으로 나오며 가슴 양옆으로 해서 신체의 흐름과 함께 하며 양평으로 내려오는데 양 끝은 역시 영기화(靈氣化)되어 말 그대로의 천의가 아니다. 하의(下衣)는 몸에 밀착하여 두 다리의 윤곽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다리에 밀착한 옷주름은 각진 계단식이며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형식을 띠고 있다.
대좌는 양감 있는 연꽃 모양이지만, 보주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고 양감이 거시 대형 불 입상을 받치고 있을 만하다. 씨방 측면을 자세히 보면 연이는 제1 영기싹이 새겨져 있다. 바로 이 연이은 제1 영기싹으로부터 관음보살이 영기화생(靈氣化生)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처음이다.
대형 소금동불상과 대좌가 함께 견고하게 접합된 경우도 처음이다. 흔히 대좌가 결실되거나 있어도 헐거운데, 이 경우는 불상 발바닥의 두 꼬다리가 돼좌의 구멍에 단단히 꽂혀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꼬다리를 대좌 구멍에 맞추어 낀 다음 조금만 비틀어도 견고하게 고정되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 도금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다.
일향한국미술사 강우방(姜友邦) 연구원장은 “이 대형 소금동불 관음보살 입상은 배면의 머리와 등 부분에 최소한의 투공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작품이다”고 감정 소감을 말했다.
또 “이 불상은 지금까지 배관해 온 불상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통일신라 초기 7세기 중반의 걸작품이라 할 만하다. 아마도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작품으로 불상 연구에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 ▲ 고려시대 12세기에 만들어진 청자새모양주자. 소장자 이무용. |
청자새모양주자(靑磁鳥形注子)는 고려 12세기의 것으로 완벽한 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개성에서 출토된 청자새모양주자 1점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뚜껑이 없다.
이무용 회장은 “귀중한 문화재를 나 혼자만의 소유물로 간직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매시장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