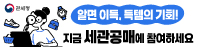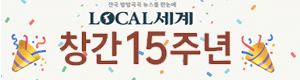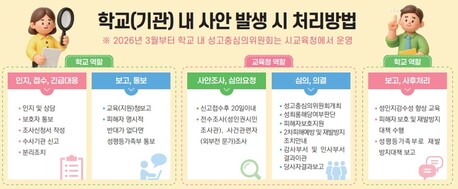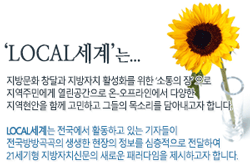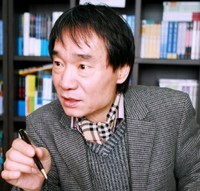 |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 |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는 홍일식 박사가 처음 사용했지만, 홍일식 박사의 이론은 영토권을 규명하는 개념의 ‘문화영토론’이 아니라, 문화가 행해지는 영토라는 의미로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 특히 인류구원의 실천 지표가 될 수 있는 ‘효’ 사상을 해외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영토를 넓혀가자는 이론이다.
따라서 홍일식 박사와 필자가 정립한 각각의 ‘문화영토론’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문화에 의해서 세계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그 개념이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른 이론이다.
필자가 주창한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문자나 도구,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종교・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정서와 사고방식까지 삶의 모든 것을 지칭하되, 그 문화가 통용되던 일정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보편성(普遍性)과 가치가 인정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진 상속성(相續性)을 갖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용범위에 따라서 민족문화, 지방 문화 등으로 나뉜다.
역사는 수평적인 개념의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적된 수직적인 개념으로, 문화와 같이 보편성과 상속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개인에 의해 돌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되는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영역 안에서 보편성을 갖추고 꾸준히 이어지는 상속성을 갖춤으로써 사회성을 동반하는 행위를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문화와 역사의 개념은 일정한 영토를 기준으로 형성되므로 일정한 영토에 축적된 문화인 역사의 주인이 문화주권자이며,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됨으로써 문화가 영토라는 문화영토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화와 역사와 영토의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영토권자를 정리하면, 지리적 국경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는 개념적 영토권자일 뿐이고, 대대로 그 안에서 문화를 누리며 생활해온, 고대부터 이어온 문화영토의 문화주권자가 실질적인 영토권자다.
그러나 문화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한 문화라면 적어도 일정한 영토에 뿌리내리고 보편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문화, 즉 영토문화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영토문화에 의해 정의된 문화주권자가 그 영토의 문화를 개척하고 꽃피우며 역사를 형성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저서 '만주의 영토권-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통해서 ‘문화영토론’은 ‘개념에 의한 지리적 국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정의했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종교전쟁이나 영토분쟁 등을 분석해 보면, 서로 문화가 다른 집단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았거나 묶으려고 하다가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처럼 교통과 통인의 발달로 문화의 이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인류가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문화영토라는 기본개념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일순간에 전 세계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가 영토라는 기본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토문화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영토문화에 대한 정의와 활용 등을 논할 ‘영토문화론’을 필요로 한다.
요즈음 필자가 정립한 ‘문화영토론’을 이용해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권에 대해 강의하는 사람이 홍일식 박사의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문화영토론’”과 본 연구자의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출처도 제대로 못 밝힌 채 혼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화가 영토라는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문화영토론’을 응용하다가는 오히려 문화영토의 정의를 혼동하게 할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 LA 한인촌에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성행하기 때문에 홍일식 박사의 이론에 의해 한민족의 문화영토라고 지칭한다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LA 한인촌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화가 영토라는 개념만 가지고 홍일식 박사의 이론과 본 연구자의 이론에 대한 개념을 혼용하면, 한인촌의 문화가 우리 한민족의 문화이니 그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만주와 대마도 등 우리 한민족의 영토이면서 이 민족에게 강점당한 영토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왜곡된 문화가 많다 보니,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부 유적이나 유물에 의해서 ‘문화영토론’에 의한 영토권을 규명한다고 하다가는 인위적으로 왜곡된 문화에 역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문화영토론’이 영토권 규명을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영토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다른 ‘영토문화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