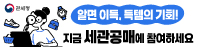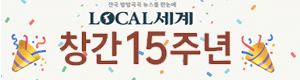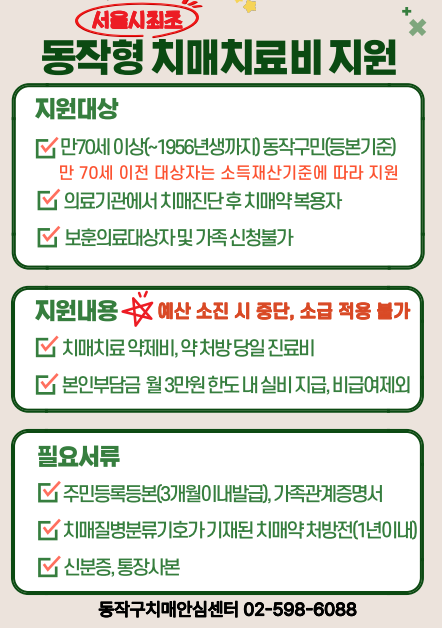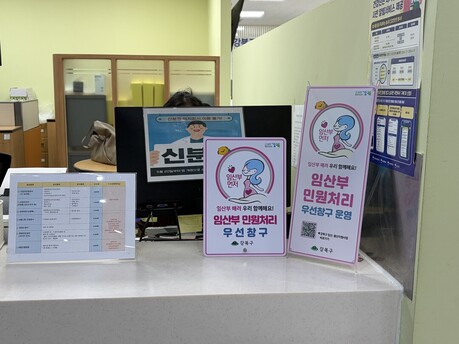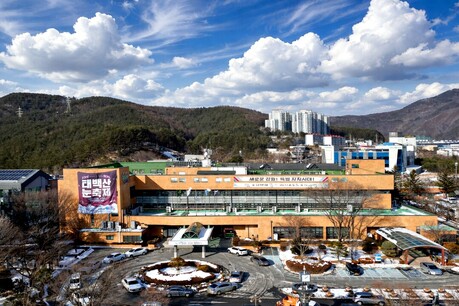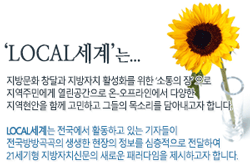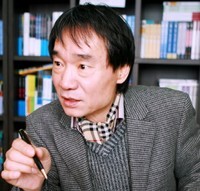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영토문화는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어떤 나라나 민족 같은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토를 기반으로 축적된 문화를 지칭한다. 영토문화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다른 문화권의 민족이나 나라가 그 영토를 지배하여 영토문화를 고착시킨 민족이 소수가 남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영토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멸실되지 않는 문화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왕래와 교역이 빈번하여 여러 민족이나 나라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화가 아니라, 고대부터 시작하여 정착과 자급자족 시대를 의미하는 농경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영토에 정착한 민족이나 집단이 누리며 전래한 고유문화라고 보는 편이 옳다.
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은 물론 저서 '대마도의 영토권'과 '만주의 영토권'에서 영토문화는 ‘시간적으로는 문화의 교류가 서로 자유롭지 못하던 고대부터 일정한 영토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영토를 개척하면서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발전시켜 오랜 시간에 걸쳐 대를 이어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동일한 문화권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일정한 영토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과정의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고유하고 항구적인 문화 산물로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된 문화로 인간과 일정한 토지 사이에서 각종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역사성과 보편성을 동반하는 문화’ 즉 ‘역사라는 종축(縱軸)과 문화라는 횡축(橫軸)의 개념을 포괄하여 고유성을 가진 것으로 일정한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문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영토문화는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지도문화, 민속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정한 영토에 두드러지게 많이 잔존하는 문화가 있다면 영토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로 보충해서 분류해야 한다.
영토문화의 개념이 정리되었다면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토문화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영토문화론’은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론으로, 영토문화의 실체를 분석하여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를 분석한 후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영토문화를 분석해서 같은 영토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를 밝혀냄으로써 일정한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것이다.
‘영토문화론’은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정한 영토, 특히 영토분쟁에 휘말린 영토에 대한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의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자를 규명해야 한다.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자 규명은 그 영토의 문화와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다.
만일 영토문화가 아니라 단순히 문헌에 의해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려고 한다면 대상 국가들이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문헌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토문화는 그 영토를 송두리째 없애기 전에는 왜곡할 수 없다. 일부를 왜곡한다고 해도 전체를 왜곡할 수는 없기에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문화영토론’에 의한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영토문화론’으로, ‘영토문화론’ 활용의 의의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