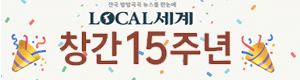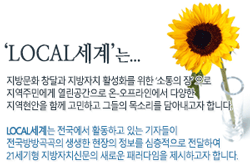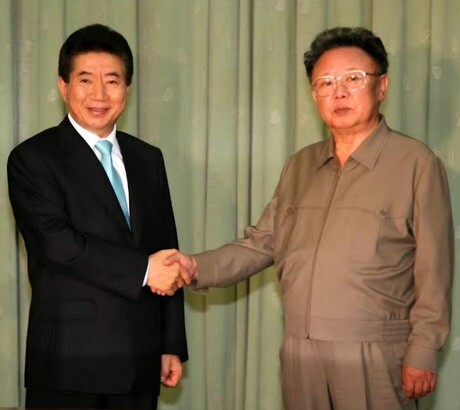|
|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
우리 사회의 의문투성이다. 이론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런가? 사람이 다스리는 인치가 아니고 법에 의한 통치가 실질적 법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가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다보니 바라보는 국민들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어떤가?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인용한 장사꾼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출발부터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한국식 재판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가? 법 앞에 자유, 평등, 진리도 간곳 없고 개인이 가진 인간의 존엄권 까지도 무시당하는 것이 약자의 항변이다.
물론 법도 어떤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공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나마 정당한 법치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이 살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죽을때까지 해도 모자란다. 사욕이 크면 클수록 시회에 불만이 커지고 자신이 낙오자처럼 고개 숙여 진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이란 말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런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회가 잘되려면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혼선 없는 법치 정책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도 인간의 삶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의 정신도 법률가의 역할에 달려 있다. 우리 법의 최종 판결과정은 대법원의 재판이다. 그 과정이 끝나면 누구나 더 이상 법적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의 정의가 법치주의의 가치만큼 공정한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